페로몬이 처음 발견된 것은 곤충에서였다. 휘발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냄새 나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곤충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 성분들을 페로몬이라고 정의하게 된 것이다. '경고 페로몬'이나 '음식물 추적 페로몬', 그리고 '성 페로몬'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한다. 페로몬 향수라고 하면 사람이 내는, 물론 동물을 유혹할 일은 없을 테니 동물 페로몬은 아니다, 냄새 성분(체취)을 향으로써 적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페로몬의 기능들 중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기능을 특별히 부각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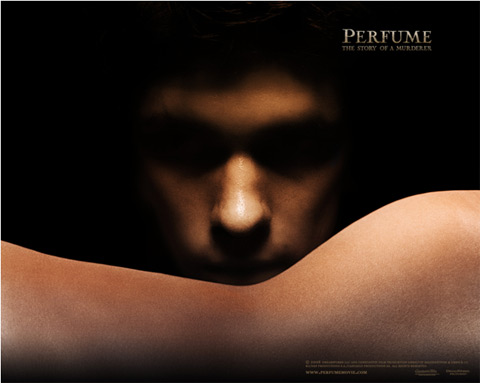
사람 페로몬을 소재로 한 영화 '향수'
물론 다른 동물들의 경우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냄새를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향료 성분으로 즐겨 사용했었던 사향(머스크)이나 시벳 향료를 그런 기능을 가진 대표적인 페로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체취가(페로몬)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사람 페로몬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검증된 과학적인 자료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로몬 향수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발견들과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다. 몇 편의 흥미로운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한다. 특히 페로몬의 경우는 추상적인 사실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증명된 사실들이 필요할 듯하여 연구 논문들을 주로 언급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흥미롭다.
첫 번째 연구는 눈물에 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의 눈물'이다. 이미 이 짧은 문장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연상하게 된다. 사랑이나 헌신과 같은 숭고한 단어들로부터 시작해서 행복, 슬픔, 이별, 배신과 같은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줄거리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고 보면 여성의 눈물이 지닌 효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구도 필요 없을 듯싶다. 마력과도 같은 효과는 누구나가 인정할 테니 말이다. 그래도 느끼는 것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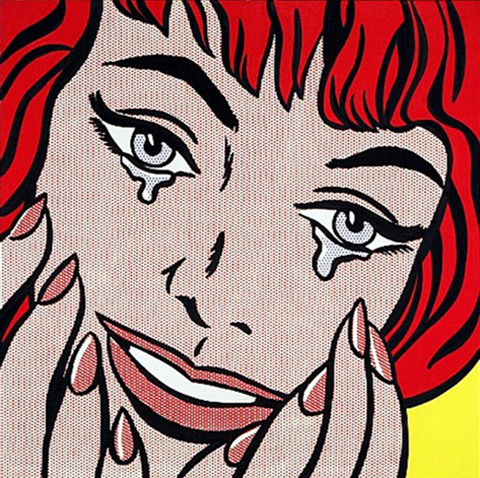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이번에 소개할 연구는 '슬픔의 눈물(행복한 눈물이 아닌)'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두 명의 여성을 선정하여(30세, 31세) 아주 슬픈 영화를 보게 한 후에 흘리는 눈물을 모았다. 그리고는 그 눈물을 24명의, 평균나이 28세의 혈기왕성한 남성들을 반으로 나누어 코 밑에 묻힌 후에 냄새를 맡게 했다.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머지 반에게는 생리식염수를 같은 방식으로 맡도록 하였다. 물론 이들에게는 무엇을 맡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았다. 그리고 눈물과 생리식염수의 냄새를 비교하게 한 경우 그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냄새를 맡은 후에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 검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성욕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변화(감정의 변화를 측정하는 전기적 피부반사 검사 등을 포함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생리식염수를 맡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의 눈물 냄새를 맡은 남성들의 경우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생리학적인 검사 지표들뿐만 아니라 성욕의 변화를 체크하는 설문조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일관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성욕의 감소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말이다. 남성 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다.

대부분의 페로몬 관련 연구들을 보면 동물들은 오줌이나 생식기 분비물 등으로(대표적인 예가 향료 성분인 사향(머스크)이나 시벳을 들 수 있다)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땀 냄새가(다음에 소개할 연구들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는 눈물에 포함된 냄새 성분 또한 일종의 의사전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곧 눈으로 직접 눈물을, 그러니까 우는 모습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하지 않아도 타인의 감정의 변화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게다가 냄새를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느끼는 것이라고 뿐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다. 마치 식스센스라고 불리는 것처럼 말이다.
감정의 변화가 있어 흘리는 눈물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경우 그 성분을 보면(모르핀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엔케팔린이란 통증억제 성분이나 호르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울고 나면 기분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이런 성분들 때문이라고) 큰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냄새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페로몬 성분인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향수로 만들어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요즘처럼 여성들이 살기에 흉흉한 세상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첫 번째 연구가 슬픔이란 감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연구는 두려움이란 감정과 관련된 연구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글,사진ㅣ패션웹진 스냅,임원철
'생활,건강,미용 > 뷰티,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펑키한 느낌의 다이렉트컬 셀프 스타일링 (0) | 2012.10.25 |
|---|---|
| 실패하지 않는 스타일링의 기본 (0) | 2012.10.24 |
| 패션계에 부는 열풍, 에코 패션 (0) | 2012.10.24 |
| 카멜레온 룩의 완성, '플랫슈즈'가 정답 (0) | 2012.10.23 |
| '원조 베이글녀' 김사랑의 패션& 뷰티 비법 (0) | 2012.10.23 |